종이별 국밥
2월의 마지막 일요일 2월23일 입니다
오늘은 좋은글 '종이별 국밥'을 올립니다
노자규 작가님의 웹 에세이을 올려드닐테니
감동적인 글어보시고, 2월의 마지막 일요일도
무리없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종이별 국밥
파스 냄새를 풍기며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가 오고 가는
할머니의 국밥집엔
언제나 사람들이 붐빕니다
낯선 남자가 들어오더니 손님들 틈 사이로 수세미를
팔아달라며 "천 원"이라 적힌 목에 두른 종이를
내보이는 데요
할머니는 하나도 팔지 못하고
빈손으로 나가는 낯선 남자를 부르더니
"밥은 먹고 다니는 교"
라고 묻습니다
"아뇨...
오늘 하루 종일 먹지 못했심더"
"이보래 주방 아줌마!
여기 국밥 한상 내온나"
허겁지겁 게 눈 감추듯 먹고 나가는
뒷모습을 보고 들어오는 손님이
한마디 거들고 나섭니다.
"할머니요! 저 사람 밥 주지 마세요
식당마다 다니면서 밥을 얻어먹심더"

그 쇠를 들은
할머니는 화를 내기는 커년ㅇ
"참말이가...?"
라며
호탕하게 웃고 난 뒤
"한달 만에 들은 소식 중에
제일 기쁜 소리구마"
할머나는
나눔은
누리가 서로에게 건넬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이란 걸
웃음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햇살 휘감아 돈은 벅찬 시간들을 머물다
떠나간 자리에 허름한 차림의 청년의 국밥
두 그릇을 시키더니
"여기 소중도 한 병 주세요"
라고 말하고선
국밥 앞에 소주를 한잔 부어 놓고는
동안거를 마친 스님처럼 한참을 바라만 보다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로 걸어 나오는 걸 보며
"왜 혼자 와서 두 그릇을 시키노?
먹지도 않을 거면서..."

"아버니께서 할모나 국밥이 먹고 싶다며 같이
걸어오시다가 결국 못드시고 다음 날 돌아가셨거든요
오늘이 떠나신 지 일년이 되는 날이고요..."
그말에
"난 배고파서 그러나 헸데이
자네라도 많이 먹어야제"
"아버니가 안 드시니 저도 입맛이 없네요"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잇던 할머니는
주방으로 젊은이를 데려가서는
"아무 말 말고 이거 퍼득 들고 가래이"
"웬 쌀을?"
가난한 고학생이란 걸
알고 있는 할머니는
"굶지 말고 다니거라...
밥은 그냥 굴 끼니까네
배고풀 때마다 오고"
계산대에 놓인
종이별들익 담긴 유리병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책갈피에 끼워둔
삶의 한 페이지를 넘겨 보이듯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아들도 살아있다면 딱 자네만 한 나이가
되엇을 긴데 밤새 기침하고 누런 못물이 나오는
아들을 새벽녁에 병원에 데려가녀니 병원비가 없지
무너가 그래서 정신없이 어제 팔던 사과를 들고
사람 많은 대로 달려간기라
'사고 하나만 사주세요"
라고 외치면서....
다들
추보 꽁꽁 언 핑판길을 헤쳐가며
출근하는 사람들 틈에서 느닷업싱 도로 정비하는
사람들이 바구니를 엎어 버리며
"여기서 장사하지 말랬죠"
눈잨에 흩어진 사과를 줍지도 못한채
배고프다고 울어대는 아이를 안고는
그 얼음판에서 젖을 머기고 있던 나를
보고는 지나던 사람들이 흩어진 사과
를 주워다 주며
"아주머니 사과 두 개만 주세요"
"저도요"
"난 그 돈을 들고 울면서 병원으로 달려가면서
생각했데이 세상은 내가 가진 걸 나누며 사는 거라고"
할먼니의 이야기는
물속으로 던져진 돌멩이가 만든 파문처럼 젊은이의
가슴속에 퍼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12월의
소나기를 머리에 이고
손톱 밑에 박힌 하현달을 매단
남루한 차림의 노숙인이 식당 앞을 기웃거리는 걸 보고는
"이 안으로 퍼덕 들오쇼"
낯선 친절에 고개를 숙인 채
나무 의자처럼 앉아 있는 그에게
할머니는 직접 큰 그릇에 고기를 듬뿍 담아내 주십니다
'법은 큰 그릇에 담다오 욕심 그릇은 작을수록
행복하 거라예" 라면서....
노숙인을 문을 열고 배웅한 할머니에게 주방 아눔마가
투덜대며 " 아이고 이 무신 냄새고 여기가 노숙인 밥
퍼주는 곳도 아니고...."
"없는 사람일수록 더 귀하헤 대해야 한데요..."
라며
빨랫줄에 먼저 나와
웃고 있는 해니머럼 웃음 짓더니
국밥집 옆에서 할머니의 배려로
붑어빵 장사를 하는 아주머니를 보며
"얼렁 들어와 국밥 먹고 장사해라" 며
외칩니다.

아들이 투명 중이라
밥한술 목구명에 넣은지 오래라는 듯
배고품을 찬으로 놓고 고마움을 국으로 먹은
붕어빵 아주머니가 오천 원을 식탁 위에 놓고 가는걸
보더니
"됐다 마!
넣어뒸다 아기 병원비에 보태라"
"맨날 얻어먹는 것도 염치고 있지예"
"그런 내 올은 자네 안 미안하게 내 받으마"
라고 말한 뒤
만 원을 거슬러 내주십시다
"할머니 천 원을 주셔야기 만 원을..."
"끝나고 벼우언에 있는 아들한테
갈 때 좋아하는 피자라도 사다주라꼬"
아주머니는 고개를 숙여 보이여
행복이하는 마음 한 조각을
가슴에 새겨 넣고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에 걸려 있는 뭉쳐진 시간 위를 지나
부부가 아이 둘을 데리고 식당에 들어와서는
엄마로 보이는 여자기 지갑을 열어보더이 국밥
두 개만 시킵니다.
잠시 후
국밥 네 개가 식탁에 놓이자
눈이 뚱그래진 엄마는
"우린 두 개만 시켜는데예"
넌지시 돋보기 너머로 보이는
아이들에게
"너거들건 이 할매가 주는 서비스데요"
그 말에
아이들이 벌떡 일어나더니
"할머니 고맙습니다"를
연거푸 하는 소리에
사람 좋은 웃음을 내보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나?"
아이들은 스스럼 없이
"돈 많은 사람요"

"아니다 바로 니네들처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인기라..."
행복을 파는 할머니의 국밥집에는
퍼내도 펴내도 행복은 솟아나는 것 같습니다.
골목에
벌써 와 누어버린 어둠을
밝혀줄 노란 달을 올려다보며
빛난 그날 밤을 비춰 주려는 듯
살아있는 종이별 들의 꿈 이야기를
듣고 있나 봅니다.
하늘인 척하는 지 애미 생일이라고
어린 아들의 따뜻한 두 손으로 접어준
종이 별을 보며
"인생사 하늘에 뜬 종이별 같다더니만"
눈물 방울 하나가
주름진 할머니의 손 등에
맺히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아이 업고 노점에서 일하며
둘이서 밤하늘을 올려다 보녀
헤아리던
그 별...
엄나는 "하늘"
난 "별"

곁에 있는 아픔보다
떠나보낸 아픔이 더 크기에
하늘이 원고지라면
한 칸 한 칸 지나온 길마다
감사함으로 곱게 물들이고
싶다는 말을 적어보고 싶다며....
엄마 없는 하늘에 별이 된 아들을
나지막이 불러봅니다
저 철로 처럼
서로 만날 순 업지만
같은 길을 가는
그래서 늘 함께하는
길과 따이 다른 건
길어야 길이지
아니면 땅인 것처럼
내 마음을 가지고만 있지 말고
길처럼 다듬어 보라며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나의 이 국밥은
가난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받쳐지지 않으면 안 된다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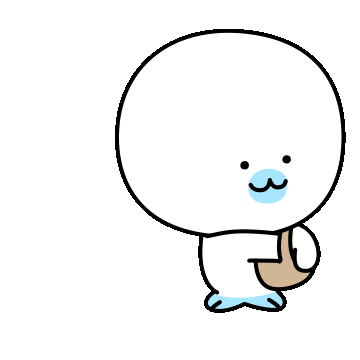
출처 :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